연구활동
5·18연구논문
<2023 5·18연구논문> 공개
- 작성자
- 비회원
- 작성일
- 2025-07-29
- 조회 수
- 38회
<2023 5·18연구논문> 공개
5·18기념재단은 5·18연구의 기반을 공고히하고,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5·18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선정된 연구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2023 5·18연구논문에 선정된 일곱 편의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 5·18연구논문(전문연구자 부문)
1. 강현정(전남대) : 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윤리적 책임 문제
2. Marcy Tanter(Ranger College) : The American involvement in Operation Splendid Vacation: A Response to the 1989 White Paper issued by the US Press Office
3. Thomas C. Adriaenssens(성균관대) : ‘Settling the Past’ in South Korea: The Legacy of Authoritarianism, Social Compensation Law, and a Hierarchy of Victimhood
4. 강남진(무등중학교) : '구술사 하기'를 통해 본 5·18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
5. 양진영(한국외대) : 5·18의 해외 인지도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 히로시마 평화기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5·18연구논문(대학원생 부문)
6. 이슬빈(Vanderbilt University) : Towards Radical Democracy with Marys: Spiritual-Political Agency of Korean Women through the Lens of Songbaekhoi’s Social Movement in the Era of Transpacific Christian Right
7. 정다인(조선대) : 들불야학의 숨결이 담긴 광천시민아파트 활성화 연구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문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이하 논문 초록 및 요약본)
※문의 : 5·18국제연구원 김주영(062-360-0577)
❍ 5·18연구논문(전문연구자 부문)
강현정, "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윤리적 책임 문제"
이 글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에서 가해자의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 이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현대 영미철학에서 한 국가 체계에 종속된 개인의 책임 문제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난제 이다. 나는 통상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들, 특히 계엄군이 단순히 5·18의 가해자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기계적인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면죄 부를 주기도 어렵다고 전제한다. 나는 현대 영미철학에서 전쟁 윤리학의 선구자인 맥맨(Jeff McMahan)의 논의를 끌어와, 계엄군의 가해적 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무지의 논증, 집단체제에서 무조건적인 명령 이행 논증과 같은 책임 회피의 논증은 그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엄군에게 정당한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Marcy L. Tanter, "The American involvement in Operation Splendid Vacation: A Response to the 1989 White Paper issued by the US Press Office"
To try to understand this reticence, in this article, I will briefly cover how a nuclear trade crisis was averted in South Korea in the mid-1970s; then, I will discuss an improtant trade deal between the US and Korea that did not have complete Congressional supprt, and speculate upon how both of these situations may have affected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the Gwangju Uprising as it was happening and culminated in a 1989 GHW Bush "white paprer" explaining the US position. I will conclude with a brief rebuttal of some of the main points of the white paper. The focus of this study is not about how Korea was finally democratized nor is it about the resilient Gwangju citizens. It is a speculative examination of why the US did little to stop the slaughter of the people in Gwangju and yet willingly "interfered" in other Korean domestic matters in the 1980s.
Thomas C. Adiaenssens, "‘Settling the Past’ in South Korea: The Legacy of Authoritarianism, Social Compensation Law, and a Hierarchy of Victimhood"
South Korea has been ruled by authoritarian regimes for most of its post-war history, unti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During this period, violence by the state against its citizens was not uncommon. Although the 2005 Framework Act on Settling the Past set up a Truth Commission to investigate such past wrongdoings, it lacked provisions on compensation. This forced victims to either litigate for redress or mobilize politically for the enactment of social compensation law. For many victims, rules of eviden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rustrated attempts to find justice through the courts, resulting in an emphasis on redress legislation over litigation. Yet, such laws often limit themselves to specific incidents or categories of victims and thereby disadvantages other victims.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work approached redress legislation holistically. It aimed to provides an overview of social compensation law for victims of domestic state violence during South Korea's authoritarian period (roughly 1948-1993). It first formulated criteria to access which victims could, to what extent, achieve redress through social compensation law. It then used these criteria to find and analyze (fifteen)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This analysis found that compensation law functioned to restrict access to redress by limiting government liability, lacked uniform terminology, and did not treat like cases alike. It also observed that the current configuration of social compensation law suggests a hierarchy of victimhood that disadvantaged non-ideal victims like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non-physical injuries, and workers.
강남진, "‘구술사 하기’를 통해 본 5·18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
이 연구는 교육과정 실현의 주체로서 교사가 재구성한 한국 현대사 교육 과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수업의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학습하는데 ‘구술사 하기’가 효과적인 학습 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술사 하기를 “학생들이 구술사를 활용하여 역사가의 작업을 경험하면서 역사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구술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구술에 대해 가지는 흥미와 관심은 과거사의 아픈 기억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있다.
3차시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구술사 하기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과 같은 10대 청소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구술자에게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구술 증언에 나타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 즉 역사적 감정이입을 거쳤기 때문에 5·18민주 화운동을 살아있는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마지막 역사 쓰기 과정에서는 구술자의 권위와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에서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를 시도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는 ‘흥미’, ‘공감’, ‘관심’, ‘기억’, ‘이해’, ‘생생함’이었는데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 수업에서 구술사 활용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재미의 요소로 구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술을 통해 어렵고 부담스러운 역사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현재 자신의 삶과 역사를 연결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사 하기를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수업 경험이 학생들에게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더깊이 공감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5·18 민주화 운동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한다.
양진영, "5·18의 해외 인지도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 히로시마 평화기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5·18의 해외 인지도 변화를 5·18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재단과 함께 국제적인 평화·인권 활동에 참여 중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해외 인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5·18 을 알리는데 필요한 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가 의거하는 구글 엔그램은 16세기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전 세계 도서의 일부를 코퍼스화한 도구로 이를 통해 5·18과 같은 특정의 역사적 사건이 전 세계 도서에서 시대별로 등장하는 추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분명히 할 것은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이 5·18의 해외 인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이 연구는 구글 엔그램이 제공하는 코퍼스에 기반해 1990년대 이후 5·18의 해외 인지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 하고, 추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해외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5·18(Gwangju Uprising)의 해외 인지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광주항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1990년대부터 구글 엔그램으로 검색이 가능한 2019년 사이의 추이와 함께 2000년–2014년 사이에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한 요인을 추론해 볼 것이다. 이어 Ⅲ장에서는 2015년 이후 5·18의 해외 인지도가 하락하게 된 요인과, 반면에 5·18기념 재단과 함께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에 참여해 국제적인 평화·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Hiroshima Peace Memorial)은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요인을 찾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항 쟁과 관련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5·18의 실태를 해외에 알릴 때필요한 방안을 제언하려 한다. 본고에서 도출된 5·18의 해외 인지도에 대한 논의는 구글 엔그램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 해외 인지 도에 영향을 준 특정의 요인에 대해서는 추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 5·18연구논문(대학원생 부문)
이슬빈, "Towards Radical Democracy with Marys: Spiritual-Political Agency of Korean Women through the Lens of Songbaekhoi’s Social Movement in the Era of Transpacific Christian Right"
This article situates the spiritual-political agency of the Korean women's democracy movement organization, Songbaekhoi, in transnational histor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rough the lens of religion. During the Cold War, the transpacific Christian Right, along with the U.S., supported the military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orchestrated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and the massacre of pro-democracy activists. In resistance, the Korean women organized Songbaekhoi (송백회; 松柏會), evoking the vigorous spirit and the uprightness of pine trees that endure severe winters. Starting as support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they grew as agents of the democratic movement by building relationships with grassroots activists, minjung theologians, and YWCA during the 1970s. As many members were Christians, their Christian faith featured relationality and creativity for coalition building embodied through their art-based activism, study groups, and political care. By contextualizing their story in the genealogy of Minjung theology and the transnational religious history, I will argue the Songbaekhoi's activism calls for a radical democracy grounded in care and relational justice by registering the once-othered at the center of a fuller democratic life.
정다인, "들불야학의 숨결이 담긴 광천시민아파트 활성화 연구"
대규모의 자본이 도시로 흘러들어오며 우리는 무엇을 보존할 것이며,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급성장한 한국 사회는 도시 개발과정에 얽힌 여러 입장들이 존재하나, 합리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우선시 되며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문화유산은 쉽사리 사람들의 인식에서 잊혀져 간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지녔던 가치와 문화의 파괴를 야기시킨다. 우리는 지역문화유산이 우리 사회에서 미래공간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현시점을 살아가며 질문하고, 상생하려 노력하는가? 광주 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 광천동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광천동 내로 흘러들어온 대규모의 개발논리 속에서 5ㆍ18의 자연발화점이라 여길 수 있는 광천시민아파트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치열하지만 대동정신이 담겨있던 이 장소는 민주화의 의지, 혹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게 과거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유형 또는 무형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얼마 남지 않은 5ㆍ18 역사공간으로서 기존의 역사적 ‘나’동을 들불야학 기념관으로 재설정하여 들불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광천동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생의 장인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새롭게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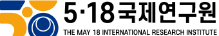
 페이스북
페이스북
 블로그
블로그
 트위터(X)
트위터(X)
